[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한국 기업의 이사회 테이블 위로 질문이 바뀌고 있다. “무엇을 약속했는가”가 아니라 “그 약속이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었는가”를 묻는 시대다. 이 전환의 전조는 해외에서 먼저, 그리고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났다.
일본은 증시가 직접 기업의 언어를 바꾸고 있다. 도쿄증권거래소는 2023년에 상장사에게 “자본비용과 주가를 의식한 경영”을 요구하면서 이사회가 개선 방안과 목표·기간을 논의해 투자자에게 스스로 계획을 공시하도록 했다.
2024년부터는 거래소가 ‘계획 공개 기업’ 명단을 매월 게시하면서, 시장 차원의 가시적 압박이 형성됐다. 2025년 7월 기준 프라임 시장의 약 92%가 관련 계획을 공시했거나 공시 검토 상태라고 밝혔다. 제도가 ‘무엇을 했는가’보다 ‘어떻게 개선하겠는가’를 시장 전면으로 끌어낸 장면이다.
![김현지 책임컨설턴트(법무법인 화우 ESG센터). [사진=법무법인 화우]](https://image.inews24.com/v1/2fe13a919fce2b.jpg)
영국은 요구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였다. 2024년에 개정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UK Corporate Governance Code)에서 이사회에 ‘중요 내부통제의 유효성’을 스스로 선언하라고 요구한다(Provision 29).
단순한 절차 나열이 아니라, 내부통제가 연말 기준으로 실제로 효과적으로 작동했는지를 설명하라는 주문이다. 지배구조의 평가 기준이 ‘문서 보유’에서 ‘작동 증거’로 이동하고 있음을 상징한다.
미국은 주주 행동주의가 준 실전 교훈이 크다. 2024년 월트디즈니의 대리인 대결에서 이사회는 주주 다수가 제기한 ‘전략·승계·보상’ 질문에 사전에 준비된 자료와 일관된 서사로 대응했고, 최종 표결에서 사측 후보 전원이 재신임됐다.
위기 직후 남는 건 화려한 홍보가 아니라, 의사결정의 근거와 절차가 차곡차곡 쌓인 기록이라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도 올여름 상법을 손봤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전체 주주로 넓히고, 독립 이사의 비율과 역할을 강화했으며, 감사위원 선임·해임시 최대주주 측 의결권을 합산 제한하는 규범을 명확히 했다.
대규모 상장사는 2027년부터 현장과 전자를 병행하는 주주총회를 열어야 하고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된다. 감사위원은 두 명 이상을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도록 한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방향은 명확하다. 독립성을 높이고, 증거 가능한 절차를 요구하며, 주주 접근성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의 과제는 무엇인가. 첫째, 비율이 아니라 역할이 보이는 이사회를 갖추어야 한다. 재무·법무·리스크·IT·ESG 등 필요 역량을 항목별로 점검해서 안건별 기여가 드러나도록 하고, 후보 추천·재선임 기준을 기여도와 결과 지표에 연결해야 한다.
둘째, 중요한 안건일수록 주주 영향에 대한 설명 틀을 갖춰야 한다. 합병·분할·유상증자처럼 민감한 사안일수록 가격 산정 근거·대안 시나리오·이해상충 차단 절차를 보고용 문장이 아닌 실질적인 의사결정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셋째, 접근성을 신뢰로 바꿔야 한다. 전자 주총은 참여 문턱을 낮추는 수단인 만큼, 그만큼 결정의 논리를 더 명확히 보여 달라는 요구로 돌아온다. 핵심 Q&A와 판단 근거를 일관된 메시지로 제시하고, 주총·IR 질의응답은 가능한 범위에서 기록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사회가 판단 과정을 근거와 기록으로 보여 줄 때, 지배구조는 비로소 설득력을 갖는다.
결론은 분명하다. 이름이 아니라 구조, 수사가 아니라 작동이 요구되는 것이다. 상법 개정은 이 변화를 ‘권고’가 아닌 ‘규범’으로 옮겼다. 이제 필요한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다. 역할이 분명한 독립이사 구성, 작동을 입증하는 의사결정 기록, 열린 주주총회 경험—이 세 가지를 조직의 일상으로 바꾸는 일이다.
그렇게 준비한 회사만이 다음 분기와 다음 주총에서 설득력 있는 답을 내놓을 수 있다.
김현지 책임컨설턴트(법무법인 화우 ESG센터) khji@yoonyang.com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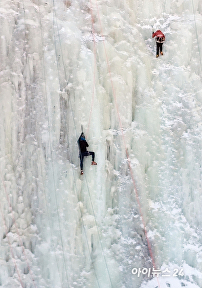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